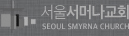허깨비에 속지마라 진리만 진짜다
김 성수 2012.08.31.
진리, 나는 지금 진리를 전하고 있는 자다. 그런데 가끔 내 입에서 나오는 ‘진리’라는 소리가 생경하게 들릴 때가 있다. 어느 때엔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게 내 아이의 이름이 맞나?’하고 고개를 갸우뚱 거린 일이 있었다. 너무나 익숙하게 아무 세포나 누르면 자연스럽게 나오던 그런 말들이 한 순간 아주 낯설게 느껴질 때, 내가 익숙한 그것이 정말 그것이 맞는가 생각하게 한다. 진리, 수없이 외친 값지고 고귀한 말.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단어가 너무 낯설다. 그리고 그걸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도 익숙하지 않다. 난 그걸 마음으로 가졌다. 그런데 난 소리로 그걸 꺼내내어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곤혹스럽다. 불타는 사명감에 목숨까지 걸어가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들이 들으면 그들의 기도 제목에 내 이름이 올라갈 일이다. 진리가 되어 진리를 전하는 자의 삶은 생기가 넘치고 만족이 넘치며 기쁨이 넘친다고 한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의 그 행위는 삶을 버티는 행위에 불과하다.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맹목으로 치닫는 나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보는 행위 정도라 할까?육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는 육적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비탈길에서 감속의 페달을 밟는 행위로 난 설교를 한다. 흐르는 시간은 인간을 부패케 하고 결국 죽음에 당도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 흐르는 시간의 바깥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된 자가 진리다. ‘나’를 흐르는 시간의 바깥에 두면 그 ‘나’는 죽음과 부패의 공포에서 당연히 벗어나게 된다. 그런데 그 ‘나’가 도저히 시간 바깥으로 튕겨져 나갈 수 없는 이 육신과 이성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고통이다. 인식론의 전환? 그건 내 능력 밖이다. 내 육은 그 본능대로 마음대로 인식한다. 그래서 가끔 사진을 본다. 그 사진 속의 나와 그니들은 시간 밖에 존재한다. 그들은 하나같이 웃고 있다. 나는 그 속에서 죽음을 망각한 찰나를 소유한 군자를 본다. 나의 모든 희망과 신념은 궁극적으로 의식의 전체주의와 악수한다. 진리를 마음으로 가졌다는 나는 여전히 모든 광휘를 의심한다. 그리고 그 의심하는 개인성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 속에 살아있는 진리의 나, 그것이 나의 유일한 안식처다. 방충망에 붙은 매미는 그의 환경에 의해 날파리로 전락한다 했던가? 매미는 숲속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법. 난 진리를 사모하는 이들 사이에서만 살아 있다. 거기서 벗어난 나는 이렇게 힘이 없다. 자칭 진리를 안다는 후배 아이를 만났다. 여전한 독설과 감지 않은 긴 머리, 히브리어 사전과 아람어 낡은 서적을 들이밀며 뭔가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듣고 있기가 힘겹다. 혹 다른 이에게 비치는 내 모습이 저렇지는 않을까? 과장된 몸짓과 과장된 언어, 그나마 혀가 어눌해 얄밉지는 않다. 그런데 힘들다. 난 알았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치일 수 없다. 그 속에 들어 있는 진리만 진짜다. 난 그렇게 삭제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왜 삭제되지 않은 육으로 힘겨워 하고 있는가? 그래, 그 녀석의 그 미운 모습도 내 인식에서 삭제해야겠지. 큰 아이가 전화를 했다.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기숙사에 들어가 밥을 해 먹고 열두시가 다 된 시간에 한 방 친구들 방해 될까봐 교정을 걸으며 전화를 한단다. 아이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많이 배어 있다. 무뚝뚝한 대학생 소년이 ‘아버님 사랑해요’를 몇 번이나 반복한다. 방학하면 바로 나올 거라는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다. 아이의 외로움이 나에게 전이가 된 걸까? 아니다. 난 나의 외로움을 그 아이의 외로움에서 읽었을 뿐이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것들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서적들과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이란 작자들. 모든 것이 덧없다. 진리는 진리대로 혼자 흘러 다닌다. 내가 애쓸 일이 아닌 것. 그래, 조금 쉽게 가자. 무례한 그니들에게도 상처받지 말고... 천천히 쉬엄쉬엄 가자. 놀멘 놀멘 하라우, 하셨다던 그 선배의 아버님 말이 오늘따라 정답다. 그냥 외로워하는 내 아이가 보고 싶다. 이게 지금의 내 진리다. |